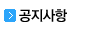[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10-24 09:03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6. 사라진 전설의 유물 대흥사 황금십자가(大興寺 黃金十字架)
7. 사라진 전설의 맥주 바스 페일 에일(Bass Pale Ale)
![360_F_807031789_3gPZUfsAFNivIQ1mXfUz4CC1lh95bSB2.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4/20241023/7606631924_486263_5e7de98d6faa0ab7ca508220fba0dded.jpg)
로마시대 소스 가룸에 대해서 역덕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룸은 로마인들이 즐겨먹은 생선소스다.
로마의 것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 기원은 옆동네 그리스인데,
그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생선머가리나 내장을 소금에 절여서 소스로 만들곤 했다.
이를 두고 가로스 혹은 가론이라고 불렀다.
재료가 재료인만큼 냄새는 영 좋지 못해서
당대에 가로스의 악취에 대해 작성된 기록들이 남아 있다.
플라톤은 친구 놈팽이가 가로스를 쳐먹고 양치질도 안 하드라며 깠고,
현장에 남은 가로스의 냄새를 증거로 삼아 범인을 잡았다는 연극이 있을 정도로 악취는 유명했다.
![istockphoto-814998268-612x612.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4/20241023/7606631924_486263_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냄새는 고약하지만 존맛이구먼~"
이 가로스는 그리스 뿐만 아니라 흑해와 소아시아 일대에서도 즐겨 먹었다.
요리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 감칠맛, 글루탐산의 맛은 매우 강렬했을 테니까.
그렇다 보니 해산물에 까다로운 유대인들도 코셔 푸드로 만든 가로스는 즐겼을 정도였다.
페니키아인들 역시 그러해서, 그들은 자기네 후신인 카르타고와 이베리아 식민지까지 가로스를 전파한다.
덕분에 이베리아, 특히 루시타니아(현재 포르투갈)는 가로스의 명산지가 되었다.
![img.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4/20241023/7606631924_486263_70032756c958173af6ba17aacc9f2778.jpg)
"으웨엑... 카르타고 색히들 대체 뭘 먹는 거야?"
"근데 저거 보리죽에 넣어봤는데 존맛이드만."
가로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탈리아에 전파된다.
하지만 냄새 때문인지 대중화 되는 것은 꽤 늦어서 기원전 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로마의 국민소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시절에 비로소 '가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대중화 되면서 여러가지 버전의 가룸들이 생산되었다.
![Pompeii_family_feast_painting_Naples.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가룸에 마늘을 갈아 넣었드만 매운맛이 더 강해지더이다!"
"나는 와인을 첨가해 봤소!"
"가알못들아, 회향하고 민트만 넣은게 레알 가룸이여!"
뭐 검색하면 나오지만 가룸은 청어나 고등어 같이 기름기 많은 생선을
암포라에 소금과 함께 켜켜이 쌓아두고,
그 위에 향이 강한 허브를 깔고 다시 생선과 소금과 허브를 겹겹이 쌓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동안 햇볕을 쬐었다가 한달에서 두달 가량 발효시키는데...
재료나 제조 방식을 달리하는 놈들도 나왔다.
제목에서 언급된 리쿠아멘도 그런 부류였다.
![unnamed.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나를 평범한 가룸이라고 여기지 말아줘. 땍깔부터 다르니까."
원래 가로스는 안 먹는 생선 머가리나 내장을 절여 발효한 것이다.
이게 가룸에 와서는 생선을 통째로 사용하는데, 리쿠아멘은 그보다 고급이었다.
재료인 생선도 다랑어 같은 고급 어종을 쓰는가하면,
심지어 냄새를 줄일 목적으로 내장과 머리를 빼고 순 생선살만 쓰기도 했다.
고급재료로 애써만든 만큼 땍깔부터 달랐는데,
최고급 리쿠아멘은 벌꿀과 같은 밝은 황금색을 띄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쿠아멘은 기본가격만 해도 현재 시가로 500달러 정도 된다.
숙성이 잘되고 맛이 좋은 최고급 리쿠아멘은 노예 1명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unnamed (1).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의사양반, 대체 상처에 뭘 바르고 있는 거요?"
"염려마시오. 이건 리쿠아멘이요. 절라 비싼 겁니다."
리쿠아멘은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곤 했는데,
개에게 물린 상처를 소독하거나, 이질, 궤양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쓰기도 했다.
또 설사나, 일사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물에 희석한 리쿠아멘을 먹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얼굴에 굵은 털과 주근깨를 제거하려고 리쿠아멘을 발랐다고 전해진다.
최초로 수도원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성인 파코니우스도
아파서 쓰러졌을때 리쿠아멘을 약으로 먹은 적이 있다고 한다.
다만 청빈함을 강조했던 파코니우스는
가룸이나 리쿠아멘을 먹지 말고 그냥 빵과 소금과 물만 먹으라 권장했다고...
![Attila.2001.CD2.avi_003463797.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아, ㅅㅂ 이거 뭔 냄새냐? 어디서 비린내 나냐고?"
"가룸 냄샙니다, 대왕. 로마놈들은 생선 썩힌 물을 죽에 넣거나 빵에 찍어 먹는데요."
로마인들에게는 국민소스였지만, 로마에 발딛는 이민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소수로 로마에 동화되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빵에 가룸을 찍어먹어야 했지만,
서로마가 붕괴하는 5세기 때 로마 식생활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단지 로마가 쇠락해서가 아니라...
![다운로드.pn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아... 감칠맛 그립구먼. 어디 남는 가룸 없나?"
"아저씨, 요새 가룸이 어딨어요? 소금도 부족한 판인데."
5세기 기후 변동으로 일조량이 급감했고, 로마시대 번성했던 염전도 쇠퇴한다.
이렇게 되니 구워서 생산하는 자염이나 암염에 의존하면서 소금가격이 폭등하였다.
한편으로 반달 해적들이 활개치면서 루시타니아를 비롯한 각지의 가룸 산지들도 문을 닫게 되었다.
여기에 게르만족들이 가알못인 점도 한몫했다.
![다운로드.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내가 명색에 왕인데 밥상이 이기 뭐고... ㅜㅜ"
"기독교도라면 청빈해야죠."
종교를 떠나서 중세 초기에 서유럽의 요리는 너무나 형편없었다.
서로마 멸망, 기후 급변으로 6세기에는 빵조차도 금값이던 암울한 시절이 있다보니
자연히 과거의 요리 문화가 단절될 수 밖에...
당연히 소스 같은 고급 식재는 만들거나 개발할 엄두를 못 내었다.
![f8b570e2f16232acd301dd9ada94c1cb.jpe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ㅅㅂ 음식이 짠맛밖에 안나냐... 뭐 색다른 거 찍어먹을 거 없냐?"
"식초, 아님 벌꿀, 아님 마늘이 있는 댑쇼."
중세 초창기에는 식초와 벌꿀이 요리에 주로 쓰였다.
그러다 와인이나 덜 여문 포도를 갈아 숙성한 주스를 소스처럼 쓰기도 했고,
매운맛을 내고자 각종 허브나 야생 양배추, 마늘을 갈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동방에서 수입되는 후추나 정향, 계피, 생강 같은 향신료는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다.
특히 후추는 황금보다 귀한 보물로 취급되어 재산목록에도 올랐을 정도.
근데 정말 가룸이나 리쿠아멘 같은 생선 소스들은 완전히 명맥이 끊어져 버렸는가...
![Colatura_di_alici_a.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나는 살아 있다! 살아 있다고 이 CVR 색히들아!!!"
로마 말기부터 '무리아'라는 소스가 사용되었는데,
이놈은 생선을 절이고 흘러나오는 소금물을 발효한 것이었다.
가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칠맛은 있었다고 한다.
한편 바다 생선을 구하기 힘들었던 지역에서는
보리나 밀을 발효하여 '무리'라는 소스를 만들기도 했다.
마치 아시아에서 콩으로 된장을 만든 것 처럼...
한편 정통 가룸의 명맥을 이은 콜라투라라는 소스도 이탈리아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것은 수도원에서 전승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엔초비, 그러니까 멸치를 소금에 재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숙성한 거란다.
한 마디로 이탈리아판 멸치액젓이라 하겠다.
현지에서는 이놈을 파스타 할때 뿌려서 요리한단다.
![fish-sauce-6_1668260187.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한편으로 서구권 일각에서는 느억맘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의 생선소스, 어간장들을
가룸의 후예들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한다.
가룸이 사라질 무렵에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어간장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론 기원전 3세기부터 중국 남부에서 어간장이 등장해서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기에
로마식 가룸이 전파되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냥 수렴진화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PS. 다음편 예고...
![20110201000031_0.jpg [ROME] 사라진 전설의 소스 리쿠아멘(Liquamen)](http://image.fmkorea.com/classes/lazy/img/transparent.gif)
"바다는 우리의 고향~"
사라진 전설의 항해민족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